목차
● 기모노의 역사
● 기모노의 종류
● 기모노(着物)에 쓰이는 문양
● 기모노(着物)에 대한 6가지 상식
● 우리나라의 한복
● 아름다운 한복의 모습
● 행사때 입는 한복
● 한복차림의 바른 예의
● 기모노의 종류
● 기모노(着物)에 쓰이는 문양
● 기모노(着物)에 대한 6가지 상식
● 우리나라의 한복
● 아름다운 한복의 모습
● 행사때 입는 한복
● 한복차림의 바른 예의
본문내용
몬기
토메소데
코몬
쯔케사게
이로무시
● 우리나라의 한복
한복이란?
한복의 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한복의 흔적을 발견한 것은 고구려 시대의 왕과 귀족들의 무덤 속 벽화에서였다. 고구려는 중국 당나라시대의 의상과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 후 한국의 왕과 몽골족 공주와의 혼사로 중국 용안시대의 옷이 한국에 들어왔고, 그것이 한복의 시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한복은 시대에 따라 저고리 길이, 소매통 넓이, 치마폭이 약간씩 달라질 뿐, 큰 변화는 없었다. 즉 한복은 둥글고, 조용하고, 한국의 얼을 담고 있다. 실크나 면, 모시로 주로 만들어졌으며, 고름의 색상이나 소매통 색상이 여자의 신분을 나타낸다. 또한 나이와 사회적 지위, 계절에 따라 색상에 변화를 줄뿐 옷의 모양은 안동의 시골아낙이나 대통령부인이나 모두 똑같다. 18m의 원단에도 불구하고 가볍고, 입기 쉬운 점이 한복의 장점이다. 명절과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 주로 입혀진다.
한국에는 약 오만개의 제작업체가 있으며, 발행부수 만 부가 넘는 한복 전문잡지도 다수가 있다.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바늘이나 실을 잦던 도구들은 가장 오래된 우리 옷의 자료이다.
또 농경 문 청동기에는 저고리와 바지의 기본 복식에 성인 남자는 상투를 하고, 미혼남자는 머리를 풀어 헤친 모습이 나타난다. 그 뒤 부족국가시대를 거쳐 삼국시대에 이르면 두루마기를 중심으로 저고리, 바지, 치마, 두루마기를 중심으로 모자, 허리띠, 화 또는 이를 착용하는 고유의 식 양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옷은 아한대성 기후로 삼한 사온이 계속되는 자연 조건과 북방 유목민 계통의 문화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속옷부터 겉옷인 두루마기에 이르기까지 몸을 싸는 형식이다. 또 저고리와 바지가 떨어져있고, 앞이 트여 있는 활동적인 옷이다. 복식이란 사람의 몸 위에 표현되는 것이다
● 아름다운 한복의 모습
● 행사때 입는 한복
○돌
여자 아이에게는 연두색이나 노랑색의 천으로 저고리를 해주고 돌이나 명절같은 특별한 날에는 색동 저고리를 입혀 아이를 곱게 꾸 몄다. 이때 저고리의 깃과 고름은 자주로 달았다. 요즈음 돌을 맞은 여자아이에게 당의를 입히는 풍습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머리에는 검정공단으로 지어 오색술을 단 조바위를 씌우기도 하는데, 아이에게 씌울 때는 수를 놓거나 금박을 입혀 화려하게 꾸미기도 한다. 조바위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굴레를 씌웠다.
남자 아이가 입는 옷은 여자아이들의 옷에 비해 가짓수가 더많다.
돌이나 명절에는 아이에게 연한색으로 옷을 해 입혔는데 보통 긴 남색 고름을 단 연분홍 저고리에 대님을 붙박은 연보라색 풍차 바 지를 입고, 그위에 남색조끼와 초록색 마고자를 입혔다. 그 겉에는 자주색으로 무를 달고, 남색으로 깃, 고름을 단 오방장 두루마기를 입혔다.
이 전대는 남자아이가 띠는 돌때이다. 머리에는 쌍희자 무늬 와 길한 문자 무늬로 금박을 입힌 복건 또는 호건을 썼다.
○결혼식(폐백옷)
결혼식에 있어 지금까지 한복의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폐백드릴 때이다 신부는 녹의홍상 즉 녹색 저고리에 빨강치마를 입고 위에 녹원삼이나 활옷을 덧 입는다. 원삼은 주로 가벼운 소재인 숙고사나 갑사로 만드는데 비해 활옷은 두꺼운 감인 양단으로 만든다. 원삼은 소매부분에 흰색, 노랑, 홍색의 천을 덧대는 것이 특징이다. 활옷의 경우 화려한 수를 놓고 소매 끝부분은 원삼과 비슷하다. 원삼의 차림을 살펴보면 가슴에 금박으로 장식한 홍대를 두르고 족두리를 쓴 다음 앞댕기를 드린다. 머리 뒷 부분에는 도투락 댕기를 드리며, 활옷에는 족두리 대신 화관으로 화려하게 장식한다. 남자의 경우 바지 저고리 위에 마고자 조끼를 입은 다음 관복을 입는데 관복은 쌍학 흉배가 달린 화려한 의상으로 머리에 사모를 쓰고 목화를 신는다.
○외출, 방문시
신혼 여행을 다녀온 뒤 시댁과 친정 어른들 댁에 들릴 때 어울리는 한복은 화려한 것보다는 전통 한복이 좋으며 화려한 색상 보다는 가라앉은 빛깔이 어울린다. 계절에 따라서는 봄, 가을은 물겹저고리·박이겹저고리, 여름은 적삼·깨끼저고리, 겨울은 누비저고리·솜저고리 등을 입는 것이 좋으며 속옷을 잘 갖춰 입어 폭이 넓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겉옷으로는 마고자 · 두루마기가 있는데, 방문시에는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는 것이 예의이다. 신랑은 바지 저고리에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를 입는다. 외출이나 예를 갖춘 자리에는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는데 여름에는 박이홀 두루마기, 봄가을은 옥색이나 회색의 겹두루마기나 박이두루마기, 겨울에는 검정이나 갈색등의 짙은 색의 솜두루마기가 적합하다. 방문시에는 남자는 두루마기를 입은 채 들어가도 실례가 아니다.
○장신구
신부의 장신구로는 노리개와 비녀 가락지가 좋으며,신발도 꼭 갖춰 신는 것이 중요하다. 핸드백은 두루마기 소재나 치마 저고리 감으로 만든 덮개백이 어울린다.
○여러 가지 개량한복
● 한복차림의 바른 예의
기본적인 것은 청결과 몸가짐이다. 특히 신부들이 처음 입는 한복이기 때문에 쩔쩔매기 일쑤다. 그러나 한복입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일이다. 길을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에는 치맛자락을 살짝 잡아 땅에 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입고 나면 치마의 겉자락은 왼쪽으로 오도록 하며 치마의 안자락과 뒷자락 겹치는 부분은 층이 나지 않도록 가지런히 여민다.
우선 한복을 입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고름 매는 법을 제대로 알도록하자. 고름은 긴고름과 짧은
고름이 있는데 긴고름을 위로 올려 고를 만든 다음 맨다. 고의 길이는 4∼5cm가 적당하며, 긴고름과 짧은 고름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이 제대로 맨 모습이다. 그리고 신발 속에는 버선을 신는데 버선은 수눅(시접)이 바깥쪽을 향하게 한다.
앉을 때는 치맛자락이 구겨지지 않게 유의하며 무릎을 굽혀 앉고 편하게 두 손을 무릎에 올려 놓는다. 등을 기대고 앉으면 옷도 구겨지거니와 어른들 보기에도 좋지 않다. 신랑은 외출시에는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며, 마고자 차림으로 외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내에서도 두루마기는 벗지 않는 것이 바른 예의이다.
토메소데
코몬
쯔케사게
이로무시
● 우리나라의 한복
한복이란?
한복의 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한복의 흔적을 발견한 것은 고구려 시대의 왕과 귀족들의 무덤 속 벽화에서였다. 고구려는 중국 당나라시대의 의상과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 후 한국의 왕과 몽골족 공주와의 혼사로 중국 용안시대의 옷이 한국에 들어왔고, 그것이 한복의 시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한복은 시대에 따라 저고리 길이, 소매통 넓이, 치마폭이 약간씩 달라질 뿐, 큰 변화는 없었다. 즉 한복은 둥글고, 조용하고, 한국의 얼을 담고 있다. 실크나 면, 모시로 주로 만들어졌으며, 고름의 색상이나 소매통 색상이 여자의 신분을 나타낸다. 또한 나이와 사회적 지위, 계절에 따라 색상에 변화를 줄뿐 옷의 모양은 안동의 시골아낙이나 대통령부인이나 모두 똑같다. 18m의 원단에도 불구하고 가볍고, 입기 쉬운 점이 한복의 장점이다. 명절과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 주로 입혀진다.
한국에는 약 오만개의 제작업체가 있으며, 발행부수 만 부가 넘는 한복 전문잡지도 다수가 있다.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바늘이나 실을 잦던 도구들은 가장 오래된 우리 옷의 자료이다.
또 농경 문 청동기에는 저고리와 바지의 기본 복식에 성인 남자는 상투를 하고, 미혼남자는 머리를 풀어 헤친 모습이 나타난다. 그 뒤 부족국가시대를 거쳐 삼국시대에 이르면 두루마기를 중심으로 저고리, 바지, 치마, 두루마기를 중심으로 모자, 허리띠, 화 또는 이를 착용하는 고유의 식 양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옷은 아한대성 기후로 삼한 사온이 계속되는 자연 조건과 북방 유목민 계통의 문화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속옷부터 겉옷인 두루마기에 이르기까지 몸을 싸는 형식이다. 또 저고리와 바지가 떨어져있고, 앞이 트여 있는 활동적인 옷이다. 복식이란 사람의 몸 위에 표현되는 것이다
● 아름다운 한복의 모습
● 행사때 입는 한복
○돌
여자 아이에게는 연두색이나 노랑색의 천으로 저고리를 해주고 돌이나 명절같은 특별한 날에는 색동 저고리를 입혀 아이를 곱게 꾸 몄다. 이때 저고리의 깃과 고름은 자주로 달았다. 요즈음 돌을 맞은 여자아이에게 당의를 입히는 풍습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머리에는 검정공단으로 지어 오색술을 단 조바위를 씌우기도 하는데, 아이에게 씌울 때는 수를 놓거나 금박을 입혀 화려하게 꾸미기도 한다. 조바위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굴레를 씌웠다.
남자 아이가 입는 옷은 여자아이들의 옷에 비해 가짓수가 더많다.
돌이나 명절에는 아이에게 연한색으로 옷을 해 입혔는데 보통 긴 남색 고름을 단 연분홍 저고리에 대님을 붙박은 연보라색 풍차 바 지를 입고, 그위에 남색조끼와 초록색 마고자를 입혔다. 그 겉에는 자주색으로 무를 달고, 남색으로 깃, 고름을 단 오방장 두루마기를 입혔다.
이 전대는 남자아이가 띠는 돌때이다. 머리에는 쌍희자 무늬 와 길한 문자 무늬로 금박을 입힌 복건 또는 호건을 썼다.
○결혼식(폐백옷)
결혼식에 있어 지금까지 한복의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폐백드릴 때이다 신부는 녹의홍상 즉 녹색 저고리에 빨강치마를 입고 위에 녹원삼이나 활옷을 덧 입는다. 원삼은 주로 가벼운 소재인 숙고사나 갑사로 만드는데 비해 활옷은 두꺼운 감인 양단으로 만든다. 원삼은 소매부분에 흰색, 노랑, 홍색의 천을 덧대는 것이 특징이다. 활옷의 경우 화려한 수를 놓고 소매 끝부분은 원삼과 비슷하다. 원삼의 차림을 살펴보면 가슴에 금박으로 장식한 홍대를 두르고 족두리를 쓴 다음 앞댕기를 드린다. 머리 뒷 부분에는 도투락 댕기를 드리며, 활옷에는 족두리 대신 화관으로 화려하게 장식한다. 남자의 경우 바지 저고리 위에 마고자 조끼를 입은 다음 관복을 입는데 관복은 쌍학 흉배가 달린 화려한 의상으로 머리에 사모를 쓰고 목화를 신는다.
○외출, 방문시
신혼 여행을 다녀온 뒤 시댁과 친정 어른들 댁에 들릴 때 어울리는 한복은 화려한 것보다는 전통 한복이 좋으며 화려한 색상 보다는 가라앉은 빛깔이 어울린다. 계절에 따라서는 봄, 가을은 물겹저고리·박이겹저고리, 여름은 적삼·깨끼저고리, 겨울은 누비저고리·솜저고리 등을 입는 것이 좋으며 속옷을 잘 갖춰 입어 폭이 넓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겉옷으로는 마고자 · 두루마기가 있는데, 방문시에는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는 것이 예의이다. 신랑은 바지 저고리에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를 입는다. 외출이나 예를 갖춘 자리에는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는데 여름에는 박이홀 두루마기, 봄가을은 옥색이나 회색의 겹두루마기나 박이두루마기, 겨울에는 검정이나 갈색등의 짙은 색의 솜두루마기가 적합하다. 방문시에는 남자는 두루마기를 입은 채 들어가도 실례가 아니다.
○장신구
신부의 장신구로는 노리개와 비녀 가락지가 좋으며,신발도 꼭 갖춰 신는 것이 중요하다. 핸드백은 두루마기 소재나 치마 저고리 감으로 만든 덮개백이 어울린다.
○여러 가지 개량한복
● 한복차림의 바른 예의
기본적인 것은 청결과 몸가짐이다. 특히 신부들이 처음 입는 한복이기 때문에 쩔쩔매기 일쑤다. 그러나 한복입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일이다. 길을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에는 치맛자락을 살짝 잡아 땅에 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입고 나면 치마의 겉자락은 왼쪽으로 오도록 하며 치마의 안자락과 뒷자락 겹치는 부분은 층이 나지 않도록 가지런히 여민다.
우선 한복을 입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고름 매는 법을 제대로 알도록하자. 고름은 긴고름과 짧은
고름이 있는데 긴고름을 위로 올려 고를 만든 다음 맨다. 고의 길이는 4∼5cm가 적당하며, 긴고름과 짧은 고름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이 제대로 맨 모습이다. 그리고 신발 속에는 버선을 신는데 버선은 수눅(시접)이 바깥쪽을 향하게 한다.
앉을 때는 치맛자락이 구겨지지 않게 유의하며 무릎을 굽혀 앉고 편하게 두 손을 무릎에 올려 놓는다. 등을 기대고 앉으면 옷도 구겨지거니와 어른들 보기에도 좋지 않다. 신랑은 외출시에는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며, 마고자 차림으로 외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내에서도 두루마기는 벗지 않는 것이 바른 예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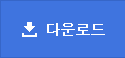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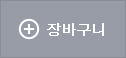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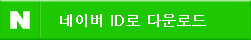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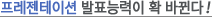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