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삼국시대의 교육과 한(漢)·당(唐) 시기 교육의 비교
1. 고구려의 교육
2. 백제의 교육
3. 신라의 교육
Ⅲ. 고려시대의 교육과 당(唐)·송(宋)·원(元) 시기 교육의 비교
1. 과거제도
2. 국학(國學)
3. 지방학교
4. 사학(私學)
Ⅳ. 조선시대의 교육과 명(明)·청(淸) 시기 교육의 비교
1. 과거제도
2. 중앙관학(中央官學)
3. 향교(鄕校)와 사학(私學)
4. 서원(書院)
5. 구교육(舊敎育)의 종결
Ⅱ. 삼국시대의 교육과 한(漢)·당(唐) 시기 교육의 비교
1. 고구려의 교육
2. 백제의 교육
3. 신라의 교육
Ⅲ. 고려시대의 교육과 당(唐)·송(宋)·원(元) 시기 교육의 비교
1. 과거제도
2. 국학(國學)
3. 지방학교
4. 사학(私學)
Ⅳ. 조선시대의 교육과 명(明)·청(淸) 시기 교육의 비교
1. 과거제도
2. 중앙관학(中央官學)
3. 향교(鄕校)와 사학(私學)
4. 서원(書院)
5. 구교육(舊敎育)의 종결
본문내용
등의 사학(私學)들이 광범위하게 설립되어 아동을 대상으로 계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명유학자(名儒學者)들이 문도(門徒)들을 모집하여 강학과 연구에 종사하는 것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다. 1437년 조선정부에서는 유사(儒士)들 중 사숙(私塾)을 설치하여 생도들을 교육한 자를 서용(敍用)하는 제도를 반포하였는데, 이것은 교육의 성과가 있는 사학(私學)의 사유(師儒)들을 장려하고 기용하는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민간교육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였다.
4. 서원(書院)
서원(書院)은 장서(藏書)와 교육·학술연구가 일체화된 기구로서, 중국에서는 오대(五代)와 송초(宋初)에 생겨났다. 한국의 경우, 990년 고려 성종(成宗) 때에 서경에 서원을 설립하여 제생들로 하여금 서적을 초사(抄寫)하여 그곳에 소장하도록 한 적이 있다. 대체로 당시의 서원은 관방(官方)의 서적을 소장하기 위한 장소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당대(唐代)의 서원과 비슷하며 송대 초기에 민간 학자들이 스스로 설립한 서원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곳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조선의 서원은 1543년(중종 38년)에 처음 건립되었다. 즉,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고려의 명유 안유(安裕)의 고거(故居)에 백운동(白雲洞) 서원을 건립한 것이 시초로서, 그 제도와 규모 면에서 모두 주희(朱熹)의 백록동(白鹿洞) 서원을 모델로 하였다. 1550년 명종(明宗)이 '소수(紹修)'라고 하는 편액( 額)과 내부(內府) 소장의 서적을 하사하고, 후에 다시 전지(田地)와 노비를 하사하였다. 이후 조선의 서원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여 숙종(肅宗) 연간(1675-1720)에는 327개의 서원(사우(祠宇) 포함)이 설립되어 그 중 131곳이 사액을 받게 된다. 그러나, 조선의 서원들 중에는 이미 작고한 명유(名儒)들을 봉사(奉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사묘(祀廟) 성격의 것이 많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조선의 서원은 학술연구를 종지(宗旨)로 하는 중국의 학자서원(學者書院)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지방교육의 보충 또는 심화 학습의 장소로 활용된 관립·사립의 서원과도 차이가 있다. 한편, 조선의 서원은 초기에는 명인(名人)의 고거에만 건립되었으나 후에는 각지에서 중복 건립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하였고, 적지 않은 서원이 지방 유력 세력들의 정치적 거점으로 타락하기도 하였다. 1692년(숙종 18년)에 조선 정부는 서원 남설(濫設)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오직 도덕과 학문이 후세의 표솔(表率)이 될만한 인물에 한하여 서원의 설립을 허가하고, 또한 한 인물에 대하여 한 곳에서만 서원을 건립하여 봉사하도록 규정하여 남설을 막고자 하였다. 그리고 보통의 현인(賢人)이나 선유(先儒)에 대해서는 향현사(鄕賢祠)에서 봉사하도록 하고 단독으로 서원을 설립하지 못하게 하였다. 1724년(경종 4년)에는 남설된 모든 서원을 훼철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1851년(철종 2년)에는 사사로이 서원을 건립하는 것을 엄금하는 명령을 하달하기도 하였다.
조선은 명·청 양조와 동시에 존재한 국가로서, 이 시기의 중국에서는 비교적 정국 변동이 적어 전통적 교육제도 또한 상당히 완비되고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청대는 기본적으로 명제(明制)를 연용하였다.) 조선의 경우에도 16세기말과 17세기초에 일본·후금(後金) 등과 교전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사회가 장기간동안 안정된 형태를 유지해 왔다. 이로 인하여 조선시대 교육사업의 제도화와 안정화 정도는 고려 등 전대(前代)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그러나, 19세기말에 이르러 이러한 형세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5. 구교육(舊敎育)의 종결
1842년(헌종 8년, 청 도광(道光) 22년) 중국과 영국 사이의 남경조약(南京條約)을 계기로 중국은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를 전후로 서양 선교사들은 중국에 여러 학교들을 설립하였으며, 중국인들이 자력으로 설립한 신식학당(新式學堂) 또한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의 경우, 1876년(고종 13년)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에 서명한 이후에야 문호를 개방하였다. 1881년 조선정부에서는 박정양(朴定陽)·어윤중(魚允中) 등 10여인을 일본에 파견하여 신제도를 고찰하게 하였으며, 김윤식(金允植)을 영선사(領選使)로 한 대표단을 천진(天津)에 파견하여 신식기계들을 학습하게 하였다. 문호 개방과 함께 중·일 양국을 대상으로 변혁의 경험을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다. 1884년에는 서양식 병원을 창건하여 '광혜원(廣惠院)'이라 불렀으며, 미국인 의사를 초빙하여 관리를 담당하게 하는 한편 학생들을 모집하여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조선 민중들과 서양 선교사들은 원산학사(元山學舍)나 배재학당(培材學堂) 등과 같은 신식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1886년에는 정부에서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설립하고 미국인을 교사로 초빙하여 수학·지리·역사·외국어 및 이과(理科) 등의 과목을 가르쳤다. 대체로 이들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이 한국 근대교육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1894년(고종 31년)의 청·일 전쟁 이후 조선은 중국의 번속국(藩屬國)이라는 명분을 완전히 벗어난다. 1897년에는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정하였으며, 신교육령(新敎育令)을 반포하여 소학교·중학교·사범학교·대학 등의 신교육체제를 정식으로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경우 대체로 1860년대에 근대교육이 출현하기 시작하여 반세기가 경과된 1903년에야 신학제(新學制)를 반포한 것에 대비하여 볼 때, 한국의 근대적 교육개혁은 중국보다 늦게 시작되었으면서도 훨씬 신속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일 양국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로 하는 가운데 근대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불과 10여 년 만에 전통교육을 근대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대체적인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러나, 얼마 뒤 한국은 일본의 침략과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고, 막 틀을 갖추기 시작한 근대교육은 식민지교육(植民地敎育)으로 변질되게 되었으며, 장기간을 지속해 온 한·중 양국 교육의 긴밀한 관계 또한 단절되게 되었다. 이후 한·중 양국의 교육은 각자 서로 다른 경로로 발전해가게 되었다.
4. 서원(書院)
서원(書院)은 장서(藏書)와 교육·학술연구가 일체화된 기구로서, 중국에서는 오대(五代)와 송초(宋初)에 생겨났다. 한국의 경우, 990년 고려 성종(成宗) 때에 서경에 서원을 설립하여 제생들로 하여금 서적을 초사(抄寫)하여 그곳에 소장하도록 한 적이 있다. 대체로 당시의 서원은 관방(官方)의 서적을 소장하기 위한 장소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당대(唐代)의 서원과 비슷하며 송대 초기에 민간 학자들이 스스로 설립한 서원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곳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조선의 서원은 1543년(중종 38년)에 처음 건립되었다. 즉,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고려의 명유 안유(安裕)의 고거(故居)에 백운동(白雲洞) 서원을 건립한 것이 시초로서, 그 제도와 규모 면에서 모두 주희(朱熹)의 백록동(白鹿洞) 서원을 모델로 하였다. 1550년 명종(明宗)이 '소수(紹修)'라고 하는 편액( 額)과 내부(內府) 소장의 서적을 하사하고, 후에 다시 전지(田地)와 노비를 하사하였다. 이후 조선의 서원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여 숙종(肅宗) 연간(1675-1720)에는 327개의 서원(사우(祠宇) 포함)이 설립되어 그 중 131곳이 사액을 받게 된다. 그러나, 조선의 서원들 중에는 이미 작고한 명유(名儒)들을 봉사(奉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사묘(祀廟) 성격의 것이 많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조선의 서원은 학술연구를 종지(宗旨)로 하는 중국의 학자서원(學者書院)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지방교육의 보충 또는 심화 학습의 장소로 활용된 관립·사립의 서원과도 차이가 있다. 한편, 조선의 서원은 초기에는 명인(名人)의 고거에만 건립되었으나 후에는 각지에서 중복 건립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하였고, 적지 않은 서원이 지방 유력 세력들의 정치적 거점으로 타락하기도 하였다. 1692년(숙종 18년)에 조선 정부는 서원 남설(濫設)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오직 도덕과 학문이 후세의 표솔(表率)이 될만한 인물에 한하여 서원의 설립을 허가하고, 또한 한 인물에 대하여 한 곳에서만 서원을 건립하여 봉사하도록 규정하여 남설을 막고자 하였다. 그리고 보통의 현인(賢人)이나 선유(先儒)에 대해서는 향현사(鄕賢祠)에서 봉사하도록 하고 단독으로 서원을 설립하지 못하게 하였다. 1724년(경종 4년)에는 남설된 모든 서원을 훼철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1851년(철종 2년)에는 사사로이 서원을 건립하는 것을 엄금하는 명령을 하달하기도 하였다.
조선은 명·청 양조와 동시에 존재한 국가로서, 이 시기의 중국에서는 비교적 정국 변동이 적어 전통적 교육제도 또한 상당히 완비되고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청대는 기본적으로 명제(明制)를 연용하였다.) 조선의 경우에도 16세기말과 17세기초에 일본·후금(後金) 등과 교전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사회가 장기간동안 안정된 형태를 유지해 왔다. 이로 인하여 조선시대 교육사업의 제도화와 안정화 정도는 고려 등 전대(前代)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그러나, 19세기말에 이르러 이러한 형세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5. 구교육(舊敎育)의 종결
1842년(헌종 8년, 청 도광(道光) 22년) 중국과 영국 사이의 남경조약(南京條約)을 계기로 중국은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를 전후로 서양 선교사들은 중국에 여러 학교들을 설립하였으며, 중국인들이 자력으로 설립한 신식학당(新式學堂) 또한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의 경우, 1876년(고종 13년)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에 서명한 이후에야 문호를 개방하였다. 1881년 조선정부에서는 박정양(朴定陽)·어윤중(魚允中) 등 10여인을 일본에 파견하여 신제도를 고찰하게 하였으며, 김윤식(金允植)을 영선사(領選使)로 한 대표단을 천진(天津)에 파견하여 신식기계들을 학습하게 하였다. 문호 개방과 함께 중·일 양국을 대상으로 변혁의 경험을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다. 1884년에는 서양식 병원을 창건하여 '광혜원(廣惠院)'이라 불렀으며, 미국인 의사를 초빙하여 관리를 담당하게 하는 한편 학생들을 모집하여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조선 민중들과 서양 선교사들은 원산학사(元山學舍)나 배재학당(培材學堂) 등과 같은 신식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1886년에는 정부에서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설립하고 미국인을 교사로 초빙하여 수학·지리·역사·외국어 및 이과(理科) 등의 과목을 가르쳤다. 대체로 이들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이 한국 근대교육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1894년(고종 31년)의 청·일 전쟁 이후 조선은 중국의 번속국(藩屬國)이라는 명분을 완전히 벗어난다. 1897년에는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정하였으며, 신교육령(新敎育令)을 반포하여 소학교·중학교·사범학교·대학 등의 신교육체제를 정식으로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경우 대체로 1860년대에 근대교육이 출현하기 시작하여 반세기가 경과된 1903년에야 신학제(新學制)를 반포한 것에 대비하여 볼 때, 한국의 근대적 교육개혁은 중국보다 늦게 시작되었으면서도 훨씬 신속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일 양국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로 하는 가운데 근대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불과 10여 년 만에 전통교육을 근대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대체적인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러나, 얼마 뒤 한국은 일본의 침략과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고, 막 틀을 갖추기 시작한 근대교육은 식민지교육(植民地敎育)으로 변질되게 되었으며, 장기간을 지속해 온 한·중 양국 교육의 긴밀한 관계 또한 단절되게 되었다. 이후 한·중 양국의 교육은 각자 서로 다른 경로로 발전해가게 되었다.
추천자료
 한국전통예절교육
한국전통예절교육 한국현대유치원교육사조사연구
한국현대유치원교육사조사연구 [한국어교육]한국어 국제화의 필요성 및 방안
[한국어교육]한국어 국제화의 필요성 및 방안 외국어로서의한국어표현교육론-교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제시하고 종합한 후...
외국어로서의한국어표현교육론-교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제시하고 종합한 후... 외국어로서의한국어표현교육론-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교사의 역할 두 가지와 이를 ...
외국어로서의한국어표현교육론-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교사의 역할 두 가지와 이를 ... 외국어로서의한국어이해교육론)‘실제성’있는 듣기 자료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한국어 숙달...
외국어로서의한국어이해교육론)‘실제성’있는 듣기 자료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한국어 숙달... 한국어교육개론(레포트)
한국어교육개론(레포트) 한국어발음교육론(레포트)
한국어발음교육론(레포트) 한국어표현교육론(레포트)
한국어표현교육론(레포트) 한국어교육개론)한국어 교수법의 변천사를 간략히 정리하고 자신의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교...
한국어교육개론)한국어 교수법의 변천사를 간략히 정리하고 자신의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교... 한국어표현교육론)학습자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교사의 역할 두 가지와 이를 선택한...
한국어표현교육론)학습자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교사의 역할 두 가지와 이를 선택한... 외국어로서의한국어이해교육론)한국어 듣기에서 듣기를 어렵게 하는 일반적인 요소에는 무엇...
외국어로서의한국어이해교육론)한국어 듣기에서 듣기를 어렵게 하는 일반적인 요소에는 무엇... 외국어로서의한국어휘교육론)관용표현을 한개 선정하여 중급학습자에게 교수하는 방안(제시설...
외국어로서의한국어휘교육론)관용표현을 한개 선정하여 중급학습자에게 교수하는 방안(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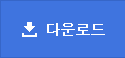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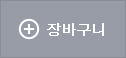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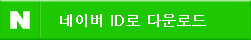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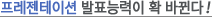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