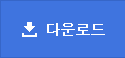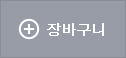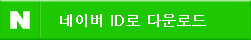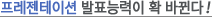목차
Ⅰ. 머리말
Ⅱ. 조선시대의 가족제도
1. 조선 초기의 가족 유형
2. 상속제
3. 장례와 제사
4. 오복제의 변화
5. 족보
6. 종법제와 친족
Ⅲ. 조선전기의 여성의 지위
1. 혼인의례에 대한 정비
2. 조선초기의 혼인제도
Ⅳ. 맺음말
Ⅱ. 조선시대의 가족제도
1. 조선 초기의 가족 유형
2. 상속제
3. 장례와 제사
4. 오복제의 변화
5. 족보
6. 종법제와 친족
Ⅲ. 조선전기의 여성의 지위
1. 혼인의례에 대한 정비
2. 조선초기의 혼인제도
Ⅳ. 맺음말
본문내용
부모에게 不順한 것과 아들을 낳지 못한 문제였는데 이 칠거지악은 여성의 지위를 극도로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한편 국가는 후처나 첩으로 인하여 고생을 같이 겪어 온 정처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제한하여 허용하지 않았다. '三不去' 또는 '三不出'이라고 하여 시부모를 위하여 3년 상에 복한 경우, 혼인 당시에는 비천하였는데 후에 부귀하게 된 경우, 처가 이혼 당한 후에 돌아갈 집이 없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국가는 부당한 이혼에 대해서는 이를 무효로 돌리고 이혼한 남편을 처벌함으로써 정식 혼례를 치룬 처의 지위를 보장해 주었다. 반면에 부당한 혼인에 대해서는 이혼케 하였으니 즉 부친·조부의 첩이나 백모·숙모를 거두어 처첩으로 한 자는 참형에 처하고 형이 사망한 후 형수를 娶妻하거나 동생이 사망한 후 제수를 취처한 자는 간음죄로 논하고 모두 이혼케 한다고 선포하였다.
29) 《大明律直解》권 6 婚姻
이와 같이 법제상에 나타나는 이혼규정은 거의 대부분 남성 위주로 편제되었으니, 이는 夫爲妻綱이라는 삼강윤리가 남편측의 혼인상의 불성실을 정당해주는 기제로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전기에는 국가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가정의 안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공식적인 이혼을 강력하게 제한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 파기로서의 별거 즉 棄妻나 疏薄正妻 등의 행위들조차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였다.
Ⅳ. 맺음말
조선을 건국한 신진사대부 세력은 성리학을 정치적·사회적 기본이념으로 삼고 유고적인 人倫道德과 禮儀凡節이 실천되는 가부장적인 양반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三綱의 윤리에 기반한 男女의 有別觀을 강조하여 양반층 부녀들의 외출을 금지하고 內外法을 강화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생활을 규제하였다.
혼인도 역시 유교적인 질서에 의해 이루어졌다. 혼인은 쌍방의 혼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법적으로는 남자 15세, 여자 14세가 되면 할 수 있었으나 士族의 딸로서 나이가 서른에 가깝도록 가난하여 혼인하지 못한 자는 국가에서 혼인비용을 도와주도록 법제화하였고, 반면에 가난하지 않은데도 서른이 넘도록 출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家長을 논죄하는 등 국가에서 간여하였다. 혼인풍습은 초기에는 고려의 유습이 남아 母系的이 성격이 강한 男歸女家婚이 보편적이어서 여성이 우대되었으나, 유교적인 질서를 강조한 양반들은 부계중심의 귀속성을 강조함으로써 모계를 농한 지배신분의 확산이나 사회적 특권의 계승을 막고자 하여 朱子家禮에 입각한 親迎制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17세기 이후 차츰 확대되어 감으로써 여성의 지위는 가부장적인 가족질서에 예속되었다.
부녀자의 再嫁는 성종 연간에 금지되었는데 그 대상은 양반층 여성이었지만 실상은 그 자손의 벼슬길을 막는 방안이었다. 여성의 재가금지는 一夫從事라는 성차별적 유교윤리에 기반한 것으로 일반 평민계층에도 영향을 주었고, 양반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기본질서가 되었다. 한편 여성은 이혼을 제가할 수 없었으며 국가는 가정의 안정을 깨지 않도록 이혼을 강력히 제한하였으며, 부당한 이혼에 대해서는 무효를 돌리고 이혼한 남편을 처벌하였으며, 가부장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棄妻나 疏薄正妻 등의 행위에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인들에게 가정에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양반들은 가부장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정 내에서 妻와 妾을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고려말이래 多妻制적인 풍조를 배격하고 禮無二嫡이라는 예법을 근거하여 一夫一妻制를 엄격히 유지하려 하였다. 重婚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주자학적인 사회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는 처의 지위는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妻·妾의 구분과 이에 종속되는 嫡·庶의 구분은 양반층의 혈통과 신분·재산의 상속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의 신분을 적극 앞세운 조치로 妾과 庶자孼은 양반사회에서 배제되어 갔다.
嫡長子 중심의 사회로의 발전은 여성의 상속상의 지위에도 영향을 주었다. 초기에는 아직 모계적인 유습이 많이 남아 있어 均分相續과 輪廻奉祀가 이루어져 여성들의 지위도 重承子를 제외한 衆子들과 동등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宗法制에 입각한 적장자 중심의 가족제도가 확립되고 이에 기반한 재산상속과 제사상속이 이루어짐으로써 여성에게 차별상속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지위가 하락되어 갔다. 가장권의 계승이나 재산의 상속, 제사권의 계승이 모두 적장자에게 집중되면서 여성은 완전히 배제되어 갔다.
요컨대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는 성리학이 정착되고 이에 따른 실천과정에서 양반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많이 변모되었다. 고려사회의 兩系的인 친족개념이 남아 있던 조선 초기에는 母系중심·外家중심의 유습이 강해 여성도 그 지위가 높았다고 할 수 있으나, 父系중심의 家父長的인 양반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양반층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 17세기 이후 宗法制가 정착되고 門中이 강화되어 적장자 우대의 부계중심의 양반사회로 변모되어 가면서 여성은 여러 권리상의 문제에 있어서 가부장제에 깊이 예속되어 갔다.
《 參 考 文 獻 》
1. 단행본
송준호, 《朝鮮 社會史 硏究》 , 일조각, 198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5》 , 1994
崔在錫, 《한국 가족 제도사》 , 일지사, 1983
이순홍, 《한국전통 혼인고》 , 학연문화사, 1992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 일지사, 1997
2. 論文
장병인,〈조선전기의 혼인제도와 여성의 지위〉, 《역사학보 25》, 창작과비평사, 1994
金一美,〈朝鮮의 婚俗變遷과 그 社會的性格〉, 《이화사학연구 4》, 1967
신영숙,〈한국가부장제의 사적 고찰〉, 《여성가족사회 34》, 1991
李鍾日,〈朝鮮前期의 戶口·家族·財産相續制 硏究〉,《국사관논총 14》, 1990
朴貞順,〈朝鮮王朝 婚俗을 中心으로 한 女性地位考〉,《인천교대논문집 9》, 1975
李棕浩,〈朝鮮初期의 相續規定〉,《馬山大學論文集 5-2》, 1983
韓嬉淑,〈兩班社會와 女性의 地位〉, 《한국사 시민강좌 15》, 1994
崔在錫,〈조선시대 가족·친족제〉,《한국의 사회와 문화 16》, 1991
한편 국가는 후처나 첩으로 인하여 고생을 같이 겪어 온 정처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제한하여 허용하지 않았다. '三不去' 또는 '三不出'이라고 하여 시부모를 위하여 3년 상에 복한 경우, 혼인 당시에는 비천하였는데 후에 부귀하게 된 경우, 처가 이혼 당한 후에 돌아갈 집이 없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국가는 부당한 이혼에 대해서는 이를 무효로 돌리고 이혼한 남편을 처벌함으로써 정식 혼례를 치룬 처의 지위를 보장해 주었다. 반면에 부당한 혼인에 대해서는 이혼케 하였으니 즉 부친·조부의 첩이나 백모·숙모를 거두어 처첩으로 한 자는 참형에 처하고 형이 사망한 후 형수를 娶妻하거나 동생이 사망한 후 제수를 취처한 자는 간음죄로 논하고 모두 이혼케 한다고 선포하였다.
29) 《大明律直解》권 6 婚姻
이와 같이 법제상에 나타나는 이혼규정은 거의 대부분 남성 위주로 편제되었으니, 이는 夫爲妻綱이라는 삼강윤리가 남편측의 혼인상의 불성실을 정당해주는 기제로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전기에는 국가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가정의 안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공식적인 이혼을 강력하게 제한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 파기로서의 별거 즉 棄妻나 疏薄正妻 등의 행위들조차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였다.
Ⅳ. 맺음말
조선을 건국한 신진사대부 세력은 성리학을 정치적·사회적 기본이념으로 삼고 유고적인 人倫道德과 禮儀凡節이 실천되는 가부장적인 양반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三綱의 윤리에 기반한 男女의 有別觀을 강조하여 양반층 부녀들의 외출을 금지하고 內外法을 강화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생활을 규제하였다.
혼인도 역시 유교적인 질서에 의해 이루어졌다. 혼인은 쌍방의 혼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법적으로는 남자 15세, 여자 14세가 되면 할 수 있었으나 士族의 딸로서 나이가 서른에 가깝도록 가난하여 혼인하지 못한 자는 국가에서 혼인비용을 도와주도록 법제화하였고, 반면에 가난하지 않은데도 서른이 넘도록 출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家長을 논죄하는 등 국가에서 간여하였다. 혼인풍습은 초기에는 고려의 유습이 남아 母系的이 성격이 강한 男歸女家婚이 보편적이어서 여성이 우대되었으나, 유교적인 질서를 강조한 양반들은 부계중심의 귀속성을 강조함으로써 모계를 농한 지배신분의 확산이나 사회적 특권의 계승을 막고자 하여 朱子家禮에 입각한 親迎制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17세기 이후 차츰 확대되어 감으로써 여성의 지위는 가부장적인 가족질서에 예속되었다.
부녀자의 再嫁는 성종 연간에 금지되었는데 그 대상은 양반층 여성이었지만 실상은 그 자손의 벼슬길을 막는 방안이었다. 여성의 재가금지는 一夫從事라는 성차별적 유교윤리에 기반한 것으로 일반 평민계층에도 영향을 주었고, 양반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기본질서가 되었다. 한편 여성은 이혼을 제가할 수 없었으며 국가는 가정의 안정을 깨지 않도록 이혼을 강력히 제한하였으며, 부당한 이혼에 대해서는 무효를 돌리고 이혼한 남편을 처벌하였으며, 가부장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棄妻나 疏薄正妻 등의 행위에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인들에게 가정에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양반들은 가부장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정 내에서 妻와 妾을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고려말이래 多妻制적인 풍조를 배격하고 禮無二嫡이라는 예법을 근거하여 一夫一妻制를 엄격히 유지하려 하였다. 重婚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주자학적인 사회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는 처의 지위는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妻·妾의 구분과 이에 종속되는 嫡·庶의 구분은 양반층의 혈통과 신분·재산의 상속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의 신분을 적극 앞세운 조치로 妾과 庶자孼은 양반사회에서 배제되어 갔다.
嫡長子 중심의 사회로의 발전은 여성의 상속상의 지위에도 영향을 주었다. 초기에는 아직 모계적인 유습이 많이 남아 있어 均分相續과 輪廻奉祀가 이루어져 여성들의 지위도 重承子를 제외한 衆子들과 동등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宗法制에 입각한 적장자 중심의 가족제도가 확립되고 이에 기반한 재산상속과 제사상속이 이루어짐으로써 여성에게 차별상속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지위가 하락되어 갔다. 가장권의 계승이나 재산의 상속, 제사권의 계승이 모두 적장자에게 집중되면서 여성은 완전히 배제되어 갔다.
요컨대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는 성리학이 정착되고 이에 따른 실천과정에서 양반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많이 변모되었다. 고려사회의 兩系的인 친족개념이 남아 있던 조선 초기에는 母系중심·外家중심의 유습이 강해 여성도 그 지위가 높았다고 할 수 있으나, 父系중심의 家父長的인 양반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양반층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 17세기 이후 宗法制가 정착되고 門中이 강화되어 적장자 우대의 부계중심의 양반사회로 변모되어 가면서 여성은 여러 권리상의 문제에 있어서 가부장제에 깊이 예속되어 갔다.
《 參 考 文 獻 》
1. 단행본
송준호, 《朝鮮 社會史 硏究》 , 일조각, 198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5》 , 1994
崔在錫, 《한국 가족 제도사》 , 일지사, 1983
이순홍, 《한국전통 혼인고》 , 학연문화사, 1992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 일지사, 1997
2. 論文
장병인,〈조선전기의 혼인제도와 여성의 지위〉, 《역사학보 25》, 창작과비평사, 1994
金一美,〈朝鮮의 婚俗變遷과 그 社會的性格〉, 《이화사학연구 4》, 1967
신영숙,〈한국가부장제의 사적 고찰〉, 《여성가족사회 34》, 1991
李鍾日,〈朝鮮前期의 戶口·家族·財産相續制 硏究〉,《국사관논총 14》, 1990
朴貞順,〈朝鮮王朝 婚俗을 中心으로 한 女性地位考〉,《인천교대논문집 9》, 1975
李棕浩,〈朝鮮初期의 相續規定〉,《馬山大學論文集 5-2》, 1983
韓嬉淑,〈兩班社會와 女性의 地位〉, 《한국사 시민강좌 15》, 1994
崔在錫,〈조선시대 가족·친족제〉,《한국의 사회와 문화 16》, 1991
추천자료
 가사조정제도를 통한 가족법상 분쟁 해결
가사조정제도를 통한 가족법상 분쟁 해결 [사회복지제도]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제도]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식민주의 시기 한국 가족법의 부계 계승제도의 특징, 역사 ,유래, 관습, 일본의 가계 계승 논...
식민주의 시기 한국 가족법의 부계 계승제도의 특징, 역사 ,유래, 관습, 일본의 가계 계승 논... 가정친화적기업,가정친화제도,가정친화적기업사례,가족친화경영.PPT자료
가정친화적기업,가정친화제도,가정친화적기업사례,가족친화경영.PPT자료 (가족생활교육 과제)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과 가족생활에 관련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서술.
(가족생활교육 과제)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과 가족생활에 관련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서술. 가족생활교육의 정의 및 개념,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 가족생활에 관련된 법 및 제도
가족생활교육의 정의 및 개념,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 가족생활에 관련된 법 및 제도 가족지원정책 중 보육지원정책과 아동수당제도의 의미
가족지원정책 중 보육지원정책과 아동수당제도의 의미 [가족복지론] 모성보호제도와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애착관계 형성의 부...
[가족복지론] 모성보호제도와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애착관계 형성의 부... [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책의 관점 -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가...
[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책의 관점 -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가... [다문화사회복지] 다문화가족정책의 발전방향 - 대상별(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
[다문화사회복지] 다문화가족정책의 발전방향 - 대상별(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 다양한 가족 출현,호주제도의 폐지,가족 변화 요인,산업화와 도시화,노인인구의 증가,한부모...
다양한 가족 출현,호주제도의 폐지,가족 변화 요인,산업화와 도시화,노인인구의 증가,한부모...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스웨덴 가족정책,가족 및 아동수당 제도,부모...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스웨덴 가족정책,가족 및 아동수당 제도,부모...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육아를 위한 휴가제도가 필요하다. 건강한 가정을 영위...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육아를 위한 휴가제도가 필요하다. 건강한 가정을 영위... 가족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탐색해보자
가족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탐색해보자